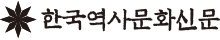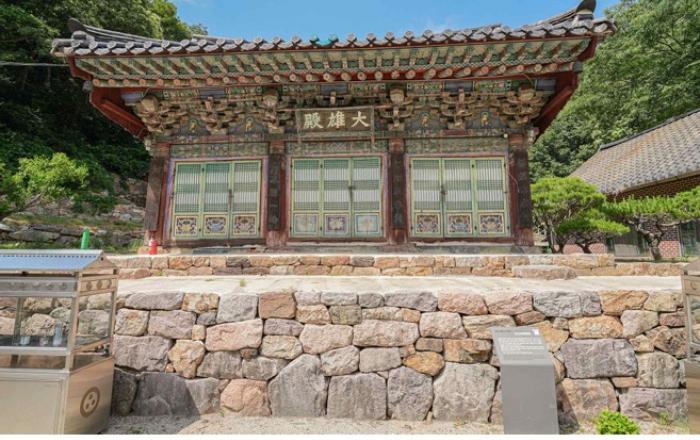1. 부처님의 본래 생각 담고 있는 경전
법화경은 대승경전의 꽃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 문학성이 뛰어나고 활발한 대승불교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서사하여 왔다. 이 경이 한역된 후에는 천태종을 비롯한 여러 종파에서 소의경전으로 신행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신행뿐만 아니라 망자의 천도 및 국가의 호국삼부경의 하나로 신행되어 경전 중에서 가장 많은 발간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듯 법화경이 널리 애송되었던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경속에는 부처의 본래 품은 생각 곧 부처의 진정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아래서 정각을 이룬 목적, 부처의 본래 서원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부처가 설한 일대 교법의 의의가 드러나 있다. 부처는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다 생사를 여의고 불도에 들게 함이 근본이념이라는 것이다. 이 이념을 펼치기 위해서 부처는 마침내 영축산에서 성대한 법회를 열었다. 여기서 부처님은 자신의 지혜 경계를 열어 보이고 그동안 설해온 교법의 진의를 밝혔다. 서품에서 문수보살이 앞에 나온 것은 실상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방편품을 시작할 때 사리불이 첫머리에 나오는 것은 방편의 지혜를 표방한 것이다. 부처는 이 실상의 지혜와 방편의 지혜로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다.
2. 백호광명 속 여섯 상서는 법화경 설법의 파노라마
이 경은 매우 드라마틱하게 시작하고 있다. 먼저 석가모니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성문 보살 천룡팔부(잡중)의 공양 공경 존중 찬탄함을 받고, 자리에 앉아 경을 설하기 전에 삼매에 들자 여태껏 설법에서 보지 못하였던 상서의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상서 속에는 앞으로 설할 법화경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부처님은 먼저 대승 《무량의경》을 설한 다음, 무량의처삼매에 들어가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 대중과 부처님 위를 덮고,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대중들이 환희에 차서 부처님을 바라보자, 부처는 삼매 속에서 백호광을 내어 동방으로 일만 팔천 세계를 비추게 된다.
이를 ‘차방의 여섯 상서’라 한다.
그 세계 속에는 지옥부터 천상계까지 육도 중생의 모습, 제불의 모습, 그 부처님들의 설법의 소리, 사중들이 득도하는 모습, 보살들이 불도를 닦는 모습, 부처님 입멸하는 모습에 이르기까지 여섯 가지 상서가 차례로 펼쳐졌다. 이를 ‘타방의 여섯 상서’라 한다. 경전은 대중들이 이 상서의 큰 뜻을 질문하고 이에 답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차방의 여섯 상서 | 타방의 여섯 상서
|
① 무량의경을 설하신 상서(설법서) ② 무량의처삼매에 드신 상서(입정서) ③ 하늘에서 꽃비내린 상서(우화서) ④ 땅이 여섯 가지 진동한 상서(지동서) ⑤ 대중이 상서에 환희한 상서(중희서) ⑥ 부처님 백호상에서 빛을 낸 상서(방광서) | ① 육취(六趣) 중생을 보인 상서 ② 제불(諸佛)을 보인 상서 ③ 제불의 설법을 들음 ④ 사중들이 득도(得度)함을 봄 ⑤ 보살들이 수행하는 것을 봄 ⑥ 부처님 열반에 들어 사리탑으로 모심을 보임 |
그러면 부처가 이러한 상서를 보인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서는 부처님 실상의 지혜에서 나온 경계이다. 그렇다면 이 경계는 부처님 마음의 투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방의 여섯 상서에서 ① 무량의경을 설함은 이 경이 장차 법화경의 서가 됨을 보여준다. 무량의경에서는 일법(一法)으로부터 무량한 법이 나와 무량한 중생을 제도함을 의미한다. ② 무량의처삼매에 듦은 법화경을 설할 입정(入定)을 보인 것으로, 법화경에서는 무량한 법이 일실상(일법)으로 귀일할 것임을 말해준다. ③ 꽃비가 내려 덮음은 모든 인(因)이 과(果) 이룸을 보여준다. 꽃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을 덮듯이 인위의 일체 중생들이 법화를 설하여 모두 불과(佛果)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함은 중생의 번뇌에 물든 육근이 법화의 설법으로 움직여 파해져서 육근청정 이룸을 의미한다. ⑤ 대중이 기뻐함은 이 경의 미증유 설법으로 모두 감응을 입을 것임을 의미한다. ⑥ 부처님 백호광을 보임은 부처님이 품고 있는 지혜의 경계를 보여준다. 이 광명 속에는 다시 여섯 상서가 보인다.
그 내용은 육취중생들이 각자의 선업과 악업에 의해 선취 악취에 윤회하면서 갖은 선업 악업의 고통 받는 모습을 보여 중생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불을 보고 그 설법을 듣게 함으로써 사중(四衆)이 되어 생사 고를 벗어나 성문 연각이 됨을, 또는 육바라밀을 닦아 불도에 들어감을 보인다. 부처는 마치 “중생들이여!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중생으로 남아서 생사고해에 윤회할 것인가. 아니면 출가수행 하여 이승(二乘) 삼승(三乘)을 통해 불도에 나아갈 것인가.”라고 묻듯이…. 이와 같이 광명 속 여섯 상서는 앞으로 설하실 부처님의 교설을 파노라마로 보여주고 있다.
3. 법화경의 구성
《법화경》은 서품부터 보현보살권발품까지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천태대사(538∼597)는 《법화경》을 두 문으로 나누어 서품에서 제14 안락행품까지를 적문(迹門)이라 했고, 제15 종지용출품 이하를 본문(本門)이라 하였다.
적문이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응화하시어 부다가야에서 성불하시고 중생을 위해 40여년 교화를 펴신 석가모니부처님 교화법문을 말한다. 이에 비해 본문이란 응화 이전의 법신불 진신의 법문으로, 진불(眞佛)은 가야성에서 처음 성불한 것이 아니라 구원겁 전에 이미 성불하여 법을 설해 왔다고 한다. 《법화경》에서 방편품은 적문의 중심이고, 여래수량품은 본문 설법의 중심이다.
서품에서 부처는 삼매 속에 있으면서 무언의 설법으로 부처의 마음을 보여 주었다면, 방편품에 이르면 무량의처삼매에서 일어나 이 세상 제법의 실상과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여 설한 제교법의 실상을 밝힌다.
부처는 삼계를 넘어서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성문 벽지불 보살계의 중생들을 제도한다. 이러한 모든 법계를 제도하자면 부처는 이런 모든 법계 제법의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하므로 법계실상을 다 알 수 있는 실상지(實相智), 이들 법계 중생들의 실상을 바로 알아 이들을 모두 제도할 수 있는 방편지(方便智)를 갖추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처의 깨달음을 이른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변정각)를 이루었다고 하고, 그 지혜를 “일체를 아는 지혜”라 하여 ‘일체종지(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