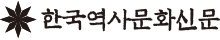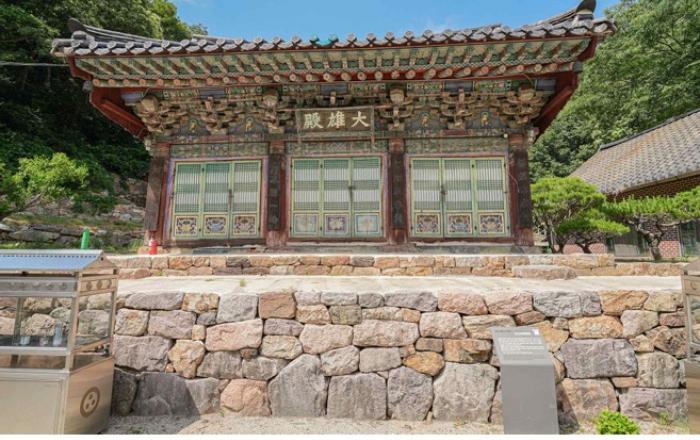행촌 이암
국조 단군 왕검의 탄신일은 음력 5월 2일로 올해 2016년은 양력으로 6월 6일(월) 이다.
이날 전국에 있는 단군 관련 단체에서는 천제를 지내는 등 많은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원래 이런 성스럽고 뜻 깊은 행사는 국가가 주도해야 마땅할 것이나, 일제식민사학에 의해 단군이 신화 속의 인물로 되다보니 기념식은커녕 어떠한 조촐한 행사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국조(國祖)를 곰의 신화로 보며 거들떠보지도 않는 정부는 아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
고려 말 문하시중을 지낸 행촌 이암 선생이 저술한 [단군세기]의 기록 중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추려 알기 쉽게 해설하여 조선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 단군세기 ] 를 저술한 행촌 이암의 생애
본관은 고성(固城). 초명은 군해(君侅). 자는 고운(古雲), 호는 행촌(杏村). 판밀직사사 감찰대부 세자원빈(判密直司事監察大夫世子元賓)인 존비(尊庇)의 손자이며, 철원군 우(鐵原君瑀)의 아들로 태어났다.
글씨에 뛰어나 동국(東國)의 조자앙(趙子昻)으로 불렸으며, 특히 예서와 초서에 능했다. 필법은 조맹부(趙孟頫)와 대적할 만하며, 지금도 문수원장경비(文殊院藏經碑)에 글씨가 남아 있다. 그림으로는 묵죽에 뛰어났다.
[ 생애와 활동사항 ]
1313년(충선왕 5)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충선왕이 그의 재주를 아껴 부인(符印)을 맡겨서 비성교감(祕省校勘)에 임명된 뒤 여러 번 자리를 옮겨 도관정랑(都官正郎)이 되었다.
충혜왕 초 밀직대언 겸 감찰집의(密直代言兼監察執義)에 올랐으나, 1332년 충숙왕이 복위해 충혜왕의 총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섬으로 유배되었다.
1340년 충혜왕의 복위로 돌아와 지신사(知申事)·동지추밀원사(同知樞密院事)·정당문학(政堂文學)·첨의평리(僉議評理) 등을 역임하였다. 충혜왕이 전교부령(典校副令)에 무인 한용규(韓用規)를 임명하자 이를 반대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충목왕이 즉위하면서 찬성사로 제수되어 제학(提學) 정사도(鄭思度)와 함께 정방(政房)의 제조(提調)가 되었지만, 환관 고용보(高龍普)가 인사행정을 공평하지 않게 처리한다고 왕에게 진언했으나 이로 인해 밀성(密城)에 유배되었다.
충목왕이 죽자 서자 저(㫝 : 뒤의 충정왕)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원나라에 다녀온 뒤 다시 정방의 제조에 임명되는 한편, 추성수의동덕찬화공신(推誠守義同德贊化功臣)이라는 호가 하사되었으며, 그 뒤 찬성사를 거쳐 좌정승에 올랐다.
공민왕 초 철원군(鐵原君)에 봉해졌으나 사직하고 청평산(淸平山)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에 제수되었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이 침입했을 때 문하시중으로서 서북면도원수가 되었으나 얼마 뒤 겁이 많아 도원수로서 군사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평장사(平章事) 이승경(李承慶)으로 교체되었다.
1361년 홍건적이 개경에 쳐들어오자 왕을 따라 남행했고, 이듬해 3월 좌정승에서 사퇴했다. 1363년 왕이 피난할 때 호종한 공로로 1등 공신으로 철성부원군(鐵城府院君)에 봉해지고 추성수의동덕찬화익조공신(推誠守義同德贊化翊祚功臣)이라는 호가 하사되었다. 우왕 때 충정왕(忠定王)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저작권자 ⓒ 한국역사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시문 기자 다른기사보기